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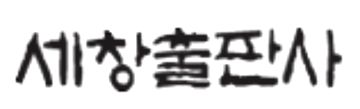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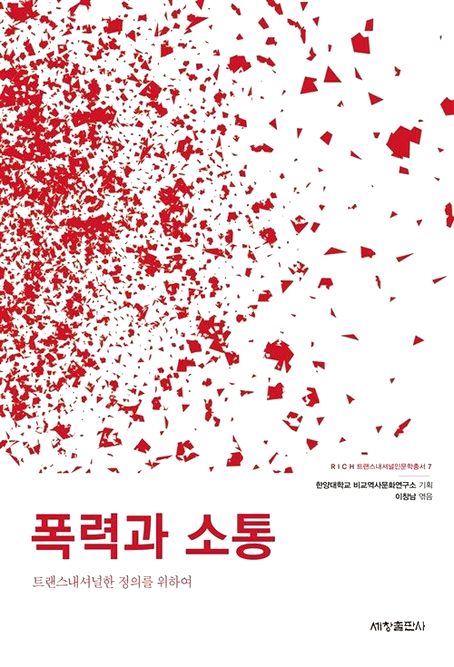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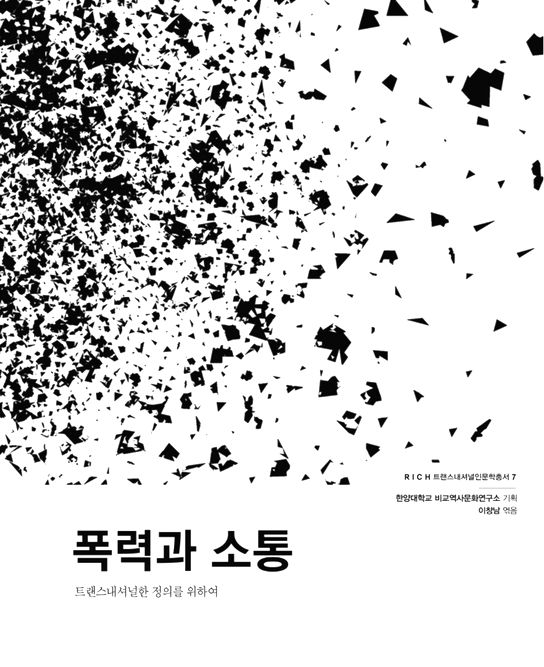 |
| 머리말 올 해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았다. 지난 전쟁에 대한 평가들이 분분했지만, 그 장대한 폭력에 대한 비판과 반성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논의되어야 할 수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또한 냉 전의 질곡을 벗어난 지금도 급격한 지구화와 더불어 경제적 구조적 불평등이 낳는 차별과 무시 그리고 그에 저항하는 폭력이 인종과 종교 간의 갈등에 불을 붙이며 지구촌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히 ‘폭력의 외부는 없다’고 할 정도로 일상적으로 편재되고 있는 오늘날 폭력의 양상을 지켜보며 시의적절한 정의의 개념과 실천전략을 새로 생각하는 일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는 과거적 의미의 정의로 역사적 과거와 현재의 폭력들이 충분히 평가되거나 해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의 필자들은 오늘날 새로이 제기되는 다양한 폭력에 대한 성찰에 있어서 이와 같이 정의의 새로운 지평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강한 국민국가들의 정의론에 머물러 있으며, 소위 글로벌화된 지구촌에서 일상적으로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인종/민족적 갈등들에 대한 진단과 대응도 과거적 정의의 관념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 심화한 현재 의식에 기초한 폭력에 대한 성찰과 전망만이 폭력의 평가와 해법에 있어서 나타나는 이러한 편향과 시대착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서 이 책은 그 문제 해결의 단초를 숙고할 수 있는 폭 력에 대한 성찰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1부 “폭력과 기억”, 2부 “자유의 역설”에서 필자들은 각각의 방향에서 그러한 문제와 관련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1부에서는 주로 물리적 폭력과 그 기억의 양상을 다양한 문헌적 자료들에 근거해서 살피면서 폭력에 대한 담론의 전 지구적 방향성을 요청하고 있다. 1부 1장 ‘전시 성폭행 문제와 정의론의 임계점들’에서 이창남은 2차 세계 대전 당시 베를린과 동부전선에서 이루어진 전시 성폭행 문제에 나타나는 역사적 쟁점들을 다루었다. 90년대 유고내전을 필두로 개시된 전시 성범죄 기소와 관련하여 오늘날의 법적, 정치적, 문화적 담론의 공간 속에서도 여전히 노정되고 있는 과거 전후 처리의 젠더편향과 이데올로기적 폭력의 정당화를 트랜스 내셔널한 정의론에 입각해서 비판하고 있다.2장 ‘오키나와, 확장되는 폭력의 기억’에서 심정명은 오키나와 출신의 작가 메도루마 슌의 소설을 소재로 오키나와에서 미군의 성폭력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 ‘전후’라는 말이 무색하게 일상 속에 지속되는 폭력과 그 기억들이 재현되는 양상을 통해 60여 년 전 폭력의 기억이 전유 되는, 혹 은 전유되어야 할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3장 ‘라틴아메리카 유해(遺骸)정치의 특징과 의미’에서 노용석은 유해의 사인에 대한 검증과 그 진실게임을 소재로 라틴아메리카의 독특한 유해정치를 다루고 있다. 특히 초국가적 특징을 지니는 라틴아메리카의 국가폭력 네트워크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그에 대한 트랜스내셔널한 접근이 불가피함을 시사하고 있다. 유럽,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 과거의 폭력들이 기억을 통해 현재화되고 있고, 여기에 작동하는 기억의 정치는 우리의 현재를 규정하는 시금석이 된다. 1부의 세 편의 글들은 이 점에 착목하여, 현재적으로 유의미한 방향에서 그에 대한 성찰적 개입이 불가피함을 역설하고 있다. 2부에서는 글로벌시대에 경제적, 구조적, 심리적 차별에 따른 폭력을 진단하고 해법 을 모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문성훈은 2부 1장 ‘지구화 시대의 폭력과 인정이론적 폭력개념’에서 인정과 무시의 연관성이 글로벌시대에 나타나는 폭력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에 기초하여 그는 인정이론적 폭력개념을 제안하는데, 이를 통해 오늘날 특히 폭력적 갈등의 이슈로 등장하는 난민, 밀입국자, 불법체류자 등 지구화의 타자들에 대한 폭력을 개념화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한 주요한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2장 ‘신자유주의적 자유의 역설과 민주적인 사회적 공공성’에서 박영도는 경제적으로 새로운 글로벌화한 현상인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자기 훈육의 원리로 관철되면서 폭력적으로 사무실과 시장을 지배하는지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그는 또한 불평등을 심화하고 자기훈육의 기제로 퇴행하는 자유의 역설이 전 지구적으로 관철되는 시점에 정의의 새로운 정치사회적 기반을 모색하고 있다.끝으로 네켈(S. Neckel-번역. 김주호)은 3장 ‘과두적 불평등’에서 후기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특권이 강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분석하면서, 소위 계층 간 이동이 경직되어 구조적으로 견고한 중세적 위계가 새로이 나타난다는 하버마스의 ‘재 봉건화’ 테제를 경험적으로 재확인하고 있다. 그는 프랭크와 쿡의 『승자독식사회』,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지구화의 불평등과 그것을 지원하는 정치사회적 제도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오늘날 심화되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인종과 종교적 갈등에 불을 붙이면서 지구화의 위협적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2 부 세 편의 글들은 이러한 현재적 폭력의 배후를 지구화와 신자유주의의 문제로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였다. 이 책의 1부와 2부는 다소 다른 방향에서 폭력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국가적 단위의 과거적 정의의 한계를 지양하고, 트랜스내셔널한 차원의 정의개념과 실천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공감을 이루고 있다. 그러한 목표는 현재화된 과거의 폭력들과 경제적 구조적 폭력의 토대들에 대한 비판적 진단 속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을 것이다. 한 권의 책으로 폭력이라는 방대한 주제를 포괄하기에는 난점이 적지 않지만, 이 책의 개개 장들은 그 성찰과 비판의 방향성을 숙고하고, 전망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1년여 전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의 <폭력과 소통> 학술회의(2015년 6월 20일)는 이 책의 토대가 되었다. 학술회의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해 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또한, 이 편서를 위해 기꺼이 원고를 내주신 필자 선생님들과 번역자 선생님 그리고 번거로운 편집 작업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세창출판사 편집진에 무엇보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무쪼록 여러 후속 작업들을 통해서 이 책에서 제시된 이디어와 고민이 이후 보다 풍부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필자들을 대신하여 이창남 |
||
| |
||
| 저자 이창남 한 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교수. 논문으로 「비교문학의 과제와 문학적 트랜스내셔널리즘」(2015), 「냉전기의 적과 동지, 그리고 벌거벗은 생명의 파톨로지」(2014)외 다수가 있으며, (편) 저서로 poesiebegriff der Athenauemszeit (2005), 『이중언어작가–근현대 문학의 트랜스내셔널한 기원을 찾아서』(2013) 등이 있고, 역서로 『독서의 알레고리』(2010), 『폴 드 만과 탈구성적 텍스트』(2007)가 있다. 현재 문학과 역사의 경계 지점에서 언어, 폭력, 도시 등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심정명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논문으로 「3.11과 전후의 끝: 무의미한 죽음과 애도의 문제」, 「‘일본’ 소설과 ‘한국’ 독자의 상상의 공동성: 오쿠다 히데오 『남쪽으로 튀어!』를 중심으로」, 「경계를 묻는 문학적 실천: 이시무레 미치코 『고해정토』로부터」가 있으며, 번역서로『유착의 사상』, 『스트리트의 사상』 등이 있다. 현재 재난의 표상, 원폭과 전쟁에 관한 기억 등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노용석 부 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논문으로 「사장님이 되었던 빨치산 : 어느 남부군 대원의 생애와 빨치산 활동의 회고」(2016), 「‘장의’에서 ‘사회적 기념’으로의 전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유해 발굴의 역사와 특징」(2015)이 있고, (편)저서로 『라틴아메리카의 인권과 국제개발협력』(2015), 『라틴아메리카의 과거청산과 민주주의』(2014)가 있다. 현재 과거사 청산 문제 및 라틴아메리카 문화인류학 등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문성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프랑크푸르트학파 기관지 『베스텐트』 한국판 책임편집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수신문> 편집기획위원, 철학연구회 연구위원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미셸 푸코의 비판적 존재론』, 『인정의 시대』가 있고, 공저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테제들』, 『포스트모던의 테제들』, 『현대정치철학의 테제들』, 『현대 페미니즘의 테제들』이 있으며, 역서로 『인정투쟁(공역)』, 『본배냐 인정이냐(공역)』, 『사회주의의 재발명』 등이 있다. 박영도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수석연구위원. 논문으로 「인권의 3원구조와 동아시아 인권」(2016),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그 딜레마와 전망」(2000)이 있고, (편)저서로 『시민들의 사회참여와 시민공동체』(2007)가 있으며, 역서로 『사실성과 타당성』(2000)이 있다. 관심 분야는 사회이론과 사상사이다. 지그하르트 네켈 (Sighard Neckel)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주요 저서로 Flucht nach vorn(2008), Strukturierte Verantwortungslosigkeit (2010)(공저), Leistung und Erschöpfung (2013) (공저) 등이 있다. 관심 분야는 사회 불평등의 상징질서, 경제적인 것의 사회학, 사회분석, 감정사회학이다. 역자: 김주호 독 일 마부르크 대학교와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각각 사회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중앙대학교 DAAD-독일유럽연구센터의 연구전담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Die paradoxe Rolle der Demokratie beim Übergang zum neoliberalen Kapitalismus in Südkorea 이 있고, 역서로 『기업가적 자아』이 있으며, 논문은 「현 시대의 자율성을 바라보는 두 시선」 등이 있다. 관심 분야는 정치사회학, 사회이론,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등이다. |
© 세창출판사
© 이창남 외 공저
 Koreanisch
Koreanisch| Inhalt Vorwort I. Gewalt und Erinnerung Kapitel 1
Kapitel 2
Kapitel 3
II. Paradoxien der Freiheit Kapitel 1
Kapitel 2
Kapitel 3
|
||
| |
||
|
Vorwort Im Jahr 2015 jährte sich das Ende des Zweiten Weltkriegs zum 70. Mal. Auch wenn die Bewertungen dieses Krieges weiterhin gespalten sind, ist die kritische Auseinandersetzung mit der epochalen Gewalt noch nicht abgeschlossen. Viele Aufgaben in Bezug auf Erinnerung, Gerechtigkeit und Verantwortung bleiben bestehen und müssen auch in Zukunft diskutiert werden. Gleichzeitig treten in einer Welt, die formal frei von den Kriegen der Vergangenheit scheint, neue Gefahren auf: Diskriminierung und Ignoranz, verstärkt durch wirtschaftliche und strukturelle Ungleichheiten, die Dynamik der Globalisierung sowie die daraus resultierende Gewalt. Konflikte zwischen Ethnien und Religionen bedrohen das fragile Gleichgewicht des „globalen Dorfs“. Angesichts einer Gegenwart, in der Gewalt zunehmend allgegenwärtig erscheint – bis hin zur These, dass es „nichts außerhalb der Gewalt“ gebe – wird es dringend notwendig, über das zeitgemäße Verständnis von Gerechtigkeit und Handlungsstrategien neu nachzudenken. Weder die historische Aufarbeitung der Vergangenheit noch die Beschreibung gegenwärtiger Gewaltphänomene lassen sich allein durch traditionelle Begriffe historischer Bedeutung oder moralischer Schuld erfassen. Die Autorinnen und Autoren dieses Buches teilen die Erkenntnis, dass ein neuer Horizont der Gerechtigkeit erforderlich ist, um die Vielfalt heutiger Gewaltphänomene zu analysieren und angemessen zu deuten. Die Bewertung des Zweiten Weltkriegs verbleibt häufig innerhalb nationalstaatlicher Gerechtigkeitskonzepte – auch im Zeitalter der Globalisierung. Doch die Diagnose und Bewältigung wachsender wirtschaftlicher Ungleichheit sowie ethnischer und religiöser Konflikte hängt entscheidend von einer vertieften Reflexion über Gewalt und Erinnerung ab. Nur ein zeitgenössisches Verständnis von Gewalt – frei von Voreingenommenheiten und Anachronismen – ermöglicht neue Antworten auf diese Herausforderungen. Dieses Buch will einen Raum für die kritische Reflexion über Gewalt eröffnen. In zwei Hauptteilen – Gewalt und Erinnerung sowie Das Paradox der Freiheit – analysieren die Autorinnen und Autoren die vielfältigen Formen gegenwärtiger Gewaltphänomene und entwerfen zugleich Perspektiven für mögliche Lösungen. Teil I untersucht vor allem körperliche Gewalt und ihre Erinnerung in Literatur und Gesellschaft. In Kapitel 1 thematisiert Lee Chang-Nam unter dem Titel „Das Problem sexueller Übergriffe in Kriegszeiten und kritische Punkte der Gerechtigkeitstheorie“ historische Gewalt an Frauen in Berlin und an der Ostfront während des Zweiten Weltkriegs. Dabei analysiert er die geschlechtsspezifischen Verzerrungen in der juristischen Aufarbeitung sexueller Gewalt in Kriegszeiten – beginnend mit dem Jugoslawienkrieg in den 1990er-Jahren – sowie die ideologische Vereinnahmung solcher Gewalt im heutigen rechtlichen, politischen und kulturellen Diskurs. Die klassische Theorie nationalstaatlicher Gerechtigkeit erweist sich dabei als unzureichend. In Kapitel 2 analysiert Shim Jeong-myeong in „Okinawa – expansive Erinnerungen an Gewalt“ die Darstellung sexueller Gewalt durch US-amerikanische Soldaten in Shun Medorumas Romanen. Er zeigt, wie Gewalt im Alltagsleben weiterwirkt und wie Erinnerung nicht als etwas „Vergangenes“, sondern als fortdauernde Gegenwart reflektiert und verarbeitet wird – und wie sie sich möglicherweise aneignen ließe. Kapitel 3, „Merkmale und Bedeutung der Politik der Überreste in Lateinamerika“ von Noh Yong-seok, beschäftigt sich mit der politischen Rolle von Exhumierungen und Erinnerungspraktiken im lateinamerikanischen Raum. Durch die Analyse von Fällen wie Salvador Allende oder Simón Bolívar zeigt er, wie ein transnationales Netzwerk der Erinnerung entsteht – ein Zugang, der zur globalen Diskussion von Gewalt beiträgt. In Europa, Ostasien und Lateinamerika wird Gewalt der Vergangenheit durch Erinnerung wieder präsent gemacht. Die Erinnerungspolitik, die sich hier vollzieht, wird zum Prüfstein, an dem sich unsere Gegenwart reflektieren lässt. Die drei Beiträge in Teil I verdeutlichen die Notwendigkeit eines aktiven, kritischen Eingreifens in die Debatten um Gewalt und Geschichte. Teil II widmet sich wirtschaftlicher, struktureller und psychologischer Gewalt im Zeitalter der Globalisierung – sowie den politischen und theoretischen Antworten darauf. In Kapitel 1 entwickelt Moon Seong-hoon in „Gewalt im Zeitalter der Globalisierung und das Konzept der anerkennungstheoretischen Gewalt“ eine neue Theorie, wonach Missachtung und der Verlust von Anerkennung zentrale Ursachen zeitgenössischer Gewalt darstellen. Auf dieser Grundlage analysiert er Gewalt gegen Geflüchtete, Migranten und andere marginalisierte Gruppen und zeigt, wie ein anerkennungstheoretischer Zugang neue Lösungsmöglichkeiten eröffnen kann. In Kapitel 2 untersucht Park Young-do unter dem Titel „Das Paradox der neoliberalen Freiheit und die demokratische Öffentlichkeit“, wie der Neoliberalismus als globales Selbstdisziplinierungsregime wirkt. Er kritisiert die Aushöhlung demokratischer Öffentlichkeit, die zunehmende Fragmentierung sozialer Bindungen sowie die Verlagerung von Verantwortung auf das Individuum und zeigt auf, wie das neoliberale Leistungsprinzip mit dem Diskursprinzip verbunden wird – oft zum Schaden demokratischer Prozesse. Kapitel 3, „Oligarchische Ungleichheit“ von Sighard Neckel (übersetzt von Kim Joo-ho), analysiert die Verstärkung ökonomischer Privilegien in einer postdemokratischen Gesellschaft. Er beschreibt die „Refeudalisierung“ der Oberschichten, in der soziale Mobilität zunehmend eingeschränkt wird, und bezieht sich dabei auf die empirisch belegten Thesen von Frank & Cook (Winner Takes All Society) sowie Thomas Piketty (Capital in the 21st Century). Die wachsende wirtschaftliche und soziale Ungleichheit wird hier als treibende Kraft hinter neuen Konflikten im Kontext von Globalisierung und Neoliberalismus verstanden. Teil I und Teil II nähern sich dem Thema Gewalt aus unterschiedlichen Perspektiven – historisch, literarisch, ökonomisch und soziologisch –, stimmen jedoch in einem wesentlichen Punkt überein: Es bedarf einer Überwindung nationalstaatlich beschränkter Konzepte zugunsten eines transnationalen Verständnisses von Gerechtigkeit, das die strukturellen Ursachen gegenwärtiger Gewalt in den Blick nimmt. Zwar lässt sich das umfassende Thema „Gewalt“ nicht in einem einzigen Band erschöpfend behandeln. Doch jedes Kapitel dieses Buches verfolgt das Ziel, kritische Reflexionen zu ermöglichen und neue Perspektiven aufzuzeigen. Grundlage des vorliegenden Sammelbands war die wissenschaftliche Konferenz Gewalt und Kommunikation, die am 20. Juni 2015 vom Institut für Vergleichende Geschichte und Kultur der Hanyang-Universität organisiert wurde. Für den Austausch von Ideen und die angeregte Diskussion möchte ich allen Beteiligten herzlich danken. Mein besonderer Dank gilt darüber hinaus den Autorinnen und Autoren, den Übersetzerinnen und Übersetzern sowie den Herausgebern des Verlags Sechang Publishing. Möge dieses Buch zur weiteren Auseinandersetzung mit der Problematik von Gewalt beitragen und neue Forschungsperspektiven anstoßen. Im Namen der Autorinnen und Autoren Chang-Nam Lee |
||
| |
||
|
Autoren Changnam Lee Sim Jeong-myeong Noh Yong-seok Sung-Hoon Moon Park Young-do Sighard Neckel Übersetzung: Kim Joo-ho |
